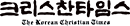월드비전 회장 취임 조명환 건국대 교수

한국 월드비전 회장으로 선임된 조명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월드비전후원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3만원씩 후원받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의 후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에이즈(AIDS)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조명환(64)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 교수에게 새로운 직함이 하나 붙었다. 국내 최대 국제구호단체 한국 월드비전의 신임 회장이다. 조 교수는 오는 2021년부터 한국 월드비전의 수장으로 국내외 구호 사업을 이끌게 됐다.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 교수는 후원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확신에 차 이야기했다. 그 또한 과거 구호단체의 후원을 받던 아동이었다.
후원받았다는 사실은 60년이라는 긴 시간 숨겨왔던 이야기다. 가난은 부끄러웠고 혹시라도 부모를 욕되게 할까 두려웠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쟁을 피해 북에서 내려온 가난한 실향민이었다. 중학교 2학년, 등록금을 내지 못해 수업 중 쫓겨났던 서러움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도 후원받은 사람이다”
후원자와의 인연은 그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맺어졌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세인트폴에 거주하는 미국인 에드나 넬슨씨는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그에게 분유와 장난감 등을 전달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애정이 담긴 편지와 함께 매달 15달러를 보냈다. 편지의 말미에는 늘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문장이 담겼다. 조 교수는 “미국 유학 시절, 노력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다. 결국 대학에서 쫓겨나 좌절했을 때에도 '에드나 어머니'의 지지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회상했다.
넬슨씨는 '독특한' 후원자였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후원을 중지시킨다. 넬슨씨는 조 교수가 성인이 된 후에도 따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후원을 지속했다. 조 교수가 건국대 교수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후원은 넬슨씨가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5년 동안 이어졌다.
조 교수와 넬슨씨의 실제 만남은 지난 1995년에서야 이뤄졌다. 조 교수는 “미국 유학 기간 몇 번이나 에드나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하셨다”며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후 더 늦으면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다. 그때 당시 에드나 어머니의 나이는 99세였다”고 말했다. 넬슨씨의 거주지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조 교수는 “에드나 어머니의 형편이 넉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며 “초등학교 교사 은퇴 후 편의점에서 일하셨다. 100년을 넘게 사셨지만 비행기를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가난한 시골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에이즈 퇴치하면서 결심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후원도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문을 두드렸다. 케네디스쿨에서는 '등록금 등 경비 1억원을 타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라'는 특이한 입학 조건을 내세웠다.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려 했지만 “내가 교수인 당신을 왜 도와야 하느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일쑤였다. 조 교수는 후원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며 돈을 모았다. “장례를 치러드리겠다” “매주 말벗이 되어드리겠다” “아드님 주례를 봐 드리겠다” 등 후원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안하는 전략도 사용했다.
그는 “부산의 한 기업에서 거절을 당한 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빈대떡 파시는 할머니를 만났다”며 “제 사연을 들으시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만원을 꺼내 후원해주셨다. 그 돈을 받았기에 배운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은 케네디스쿨 졸업 후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 되면서 실현됐다. 면역학 박사였던 그는 과학자로서 신약을 개발해도 가난한 이들에게 약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다. '현장의 과학자'로서 발로 뛰어야 에이즈를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치료를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에이즈 퇴치 기부금을 모았다.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가, 반군 지도자와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았다.
후원과 뗄 수 없었던 삶이기에 한국 월드비전 회장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 2막'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는 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제1순위로 꼽았다. 조 교수는 “월드비전은 투명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후원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투명성 제고 제1과제
이와 함께 후원자에게 기구 운영과 관련한 '설득'도 시도할 방침이다. 조 교수는 “3만원을 후원하면 3만원이 모두 아이에게 가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면서 “월드비전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효율적으로 후원금을 분배하고 있다.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기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후원자에게 설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중점
'고통 없는 후원금'도 그가 중점적으로 고려 중인 사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8개국에서는 비행기 티켓 요금에 1000원씩 국제의약품구매기구 기부금이 붙는다. 지난 5년 동안 약 2조원이 기부금으로 모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에이즈·말라리아·결핵 어린이 환자 100만명이 무료로 치료받고 있다. 조 교수는 “기업과 접촉해 3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 1만원을 기부받는 방식 등을 구상 중”이라며 “누구나 생활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국민일보>